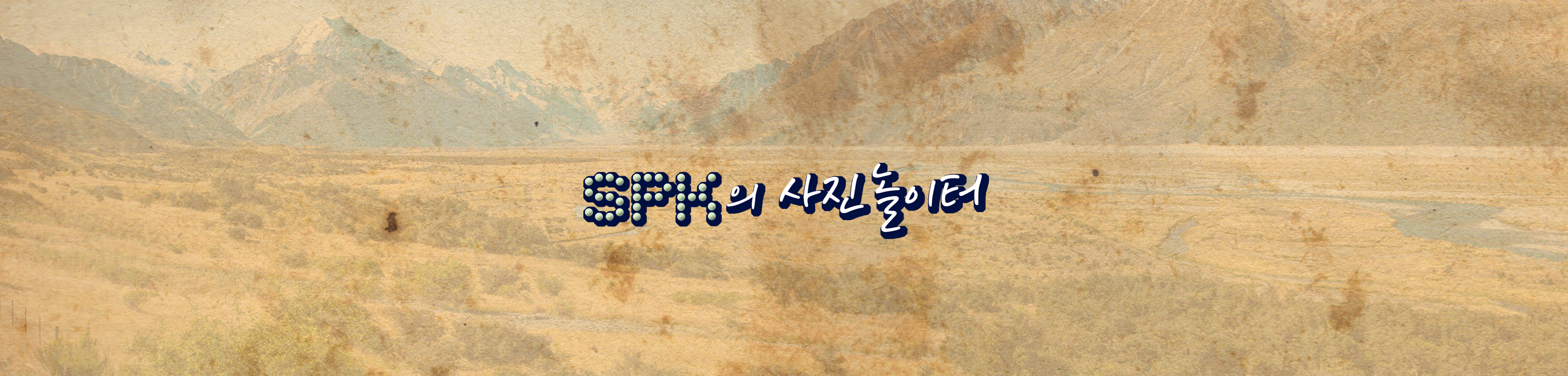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 두려움
그리고 고통은 모두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도 나에게 달려 있다.
번뇌와 죄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길
하나 뿐이다.

이생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세상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큰 사랑과,
하늘이 무너져도 꺾이지 않을 용기와,
땅이 꺼져도 흔들리지 않을 양심이 있어야 한다.

'소원(所願)'과 '서원(誓願)'은 다르다.
소원은 원하는 바요, 되었으면 하는 기대심이다.
서원은 맹세하는 다짐이요, 자기 스스로 구체적으로 이루겠다는
적극적 발심(發心)이다.

삶의 재충전이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비우지 않고서는 채울 수도 없다.
이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호랑이에 쫒기듯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꿈은
몸부림을 통해서만 깨어날 수 있다.
이 절박한 몸부림이 바로 수행이요, 정진이요, 공부이다.

머리로 책을 많이 읽고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행으로 관념을 닦아서 몸이 즉, 마음이 알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머리의 생각으로만 존재하던 모든 것들이
몸과 마음에서 실천되고 실현된다.
즉, 수행은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서 얻어지는 지혜와 실천력이다.

모든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온다.

분리된다는 것은 서로가 헤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자가 며칠째 잠을 못 자 눈이 퀭하게 들어갔다.
걱정된 스승이 제자에게 왜 그리 얼굴이 상했느냐고 물었다.
“요사이 며칠째 통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이루는 것이더냐?”
“실은 친구가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험담을 하며
나쁜 아이라고 저를 욕하고 다닌다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화를 낼 일이 전혀 아니로다.
먼저 너 자신을 잘 살펴보거라.
친구의 소문이 사실이면 사실을 말한 것이니 화낼 일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 그 또한 속상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글 출처/ 인터넷 여기저기...